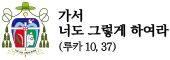쌍백합 제76호(봄) 신앙의 오솔길
본문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파울로 코엘료Paulo Coelho의 소설 『순례자』에는 이런 일화가 있다. 어느 아침 부다가 제자들 한가운데에 앉아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다가와 물었다. “하느님이 과연 존재합니까?” 부다는 “존재한다.”라고 대답했다. 점심 후에 다른 남자가 부다를 찾아왔다. 그도 하느님의 존재 여부를 알기 원했다. 부다는 “아니오. 하느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저녁에 세 번째 남자가 와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 “하느님은 존재합니까?” 부다는 “그것은 당신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를 지켜보던 제자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 너무 황당합니다. 같은 질문에 대해 어떻게 각기 다르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부다가 대답했다. “나에게 질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라네. 각자는 자신의 방식으로 하느님께 다가선다네. 확신을 통해서 혹은 부정이나 의심을 통해서 하느님을 깨닫는다네.”
이 일화가 말하는 바는 분명하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이와 더불어 천국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방식대로 결정을 내려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런 부정적 결정을 내렸고, 그에게는 천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에게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셈이다. 따라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이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존재를 믿기로 결정하면, 그 의심은 이내 사라진다.
하느님과 천국에 대한 어렴풋한 앎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느님과 천국에 대한 어렴풋한 앎이 주어져 있다. 이런 어렴풋한 앎은 일상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일깨워진다. 칼 라너Karl Rahner(1904-1984)는 소책자 『일상』에서, 일상의 작은 일들이 말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작은 일들이 영원의 전조라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온 하늘을 담고 있는 물방울처럼 그 자체 이상의 무엇이며,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표지, 다가오는 무한을 미리 알리면서도 그런 메시지에 놀라는 전령과 같다는 것이다. 라너의 글을 직접 인용해보자. “왜냐하면, 작은 것은 큰 것의 약속이며, 시간은 영원의 생성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몇 가지 전령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전령은 강이다. 우리는 강에 관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곧 강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마지막 목적지인 바다마저 생각한다. 그리고 강이 수많은 굽이를 거쳐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 목적지인 천국에 다다르기까지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는다. 이처럼 피상적인 것에서 삶의 소중한 진리를 찾아내는 순수한 묵상이 중요하다.
둘째 전령은 애벌레이다. 애벌레는 우리의 통상적인 기대와는 달리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날아오른다. 곧 나비가 되어 이 꽃 저 꽃으로 경쾌하게 날아다닌다. 그래서 나비는 삶의 가변성을 상기시킨다. 이미 중세시대에 나비는 영혼의 불멸성,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옮아감을 상징했다. 그리스인들에게 단어 ‘프쉬케psyche’는 나비뿐만 아니라 영혼도 의미했다.
생명이 없는 듯한 번데기를 거쳐 현란한 나비로 점점 커지는 애벌레의 변화는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십자가에 달림, 죽음과 부활 등의 사건 전체를 나타낸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우리를 더 높고, 더 활력 있는 생명으로 변모시켜주신다. 애벌레가 고치 안에서 잠자다가 결국 한 마리의 나비로 변화되는 것과 같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럽에서 17세기와 18세기의 수많은 묘비에 나비의 형상이 나타났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초기 낭만주의의 독일 작가 노발리스Novalis(1772-1801)는 폐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가 죽은 후에 발표된 작품 가운데 하나는 『하인리히 폰 오프터딩겐Heinrich von Ofterdingen』(1802년 발표)인데, 여기에서 그는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하고 묻는다. 그리고 ‘항상 집으로 간다!’라고 그는 대답한다. 우리 인생은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를 늘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암시는 하느님과 천국을 어느 정도 알려주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근거는 아니다. 그 본질적인 근거는 프랑스 작가 프랑스와 모리악François Mauriac(1885-1970)이 1953년 11월 14일 파리에서 개최된 ‘가톨릭 지성인들의 모임’에서 행한 ‘살아계신 하느님’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이야기를 했던 그 하느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2티모 1,12)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분을 과연 잘 알고 있습니까?”
이어서 모리악은 자신의 고유한 인격과 관련지어 이렇게 고백한다. “제가 정확한 날짜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께서 먼저 제 삶에 당신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리스도 없이 살아 계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느님 곧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교 생활의 핵심이며, 모리악 삶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사실 모리악의 신앙생활과 문학 활동에서 결정적인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리악은, 우리 인간이 하늘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며,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 자녀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여정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임을 깨달았다. 하느님께서 하늘에 계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이런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경은 천국의 존재를 애써 증명하지 않는다. 거기에서 하느님과 천국은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마태오복음의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6,9)라는 표현을 들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유다 백성의 장구한 역사에까지 소급된다. 유다인은 수천 년 동안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장소를 지칭할 때 줄곧 ‘하늘’을 말했다. 하늘은 땅 위에 별들이 떠 있는 둥근 창공을 지칭한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지상의 일부분이나 하늘의 일부분은 아니시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라는 표현은 본래 도저히 가까이할 수 없는 하느님의 속성을 지칭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초월자이시다. 그분은 특히 세상의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 인간이 “형언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비잔틴 전례) 분이시다. 이러한 이유에서 부정否定신학이 거론된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하느님께서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다만 무엇이 아닌지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함부르크의 공동묘지에는 인상적인 묘비들이 많다. 그 가운데에는 조각가 에른스트 바를라흐Ernst Barlach(1870-1938)의 초기 작품도 있다. “저승을 엿들음”이 그것인데, 이는 바를라흐가 1900년에 만든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어떤 젊은 부인이 24살에 죽은 자기 남편에게 어떤 영원한 운명이 주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몸을 천국 문에 기대어 무언가를 엿듣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저승을 엿들음”은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초적 욕구이지만, 어떤 인간도 그것을 결코 듣지 못한다. 하늘은 인간이 결코 다가설 수 없는 하느님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늘은 하느님의 본질을 잘 해석하고 있다. 하늘은 곧 ‘완전히 다른 존재’이다.
하느님의 이런 이타성異他性에 대해 우리는 온전히 상상할 수 없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이다운 신앙으로, 어린이다운 희망으로 당신을 우리 아버지로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바로 이런 절대적 이타성 안에 영원한 집인 우리의 고향이 있기 때문이다.